토마스 만, 홍성광 옮김, ⟪토니오 크뢰거⟫, 열린 책들,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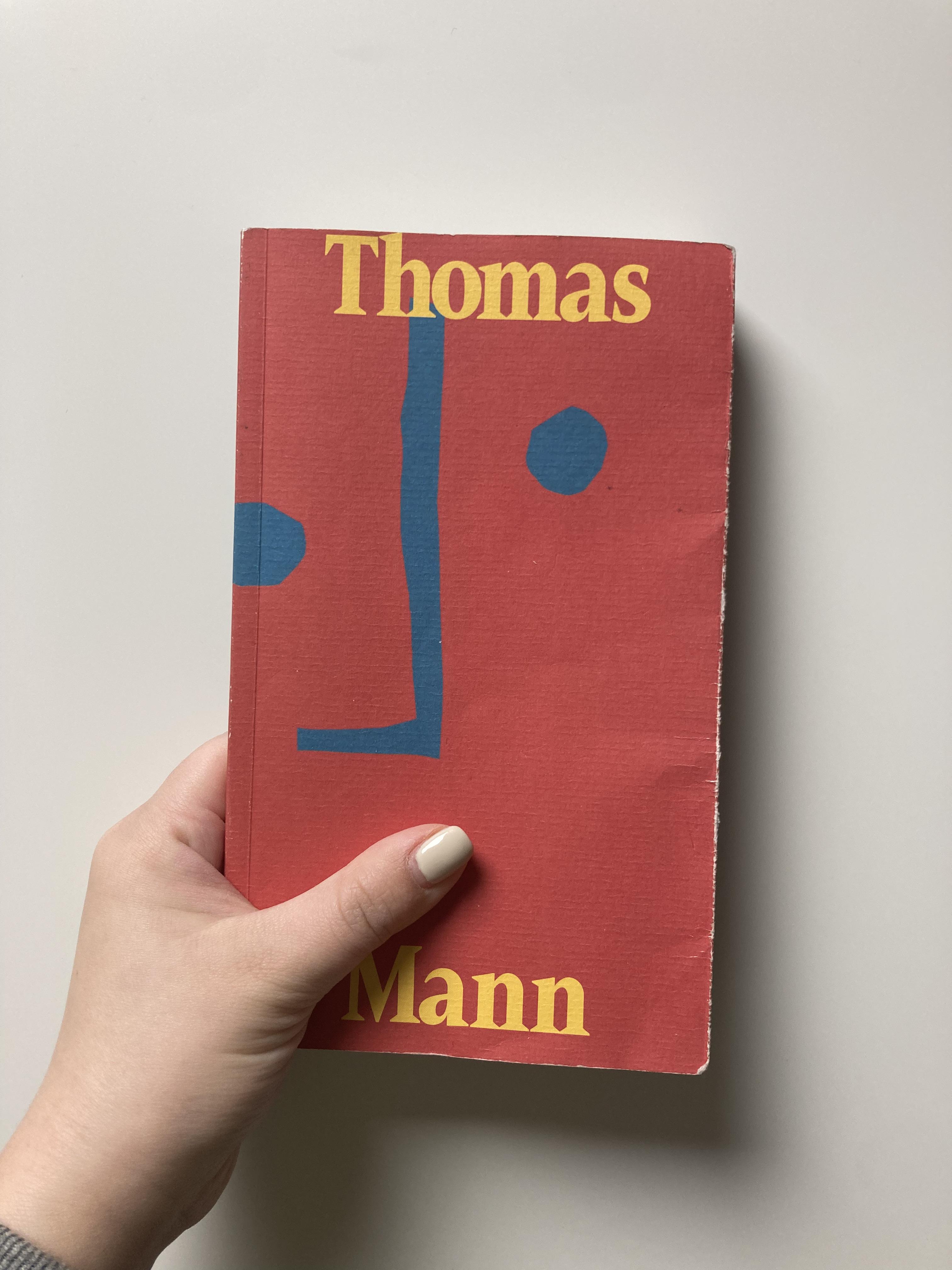
진실하고 인간적인 감정 일체로부터 스스로가 유리되었음을 느끼고, 단지 시민 크뢰거가 되기를 꿈꾸는 시인 토니오. 시인은 이를테면 사랑 자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느라, 단순하고 소박한 실재의 세계를 떠나 끝없는 사색에 지치게 만드는 정신의 자장 속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질서 잡힌 생활을 동경하는 예술가가 세상에 대해 쏟아내는 질투를 설득력 있게 그려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생활인들은 토니오의 삶을 동경할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고 만다. 그럼에도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꼭 읽어보고 싶게 되었다.
가장 좋았던 대목. "관능에 대한 혐오감과 증오심에 사로잡혀 순수함과 품위 있는 평화를 갈구하는 동안에도 그는 예술적인 공기, 늘 봄과 같이 따뜻하고 감미로우며 향기를 머금은 공기를 호흡했다. 이러한 공기를 맡으면 은밀한 생식의 환희에 몸이 근질거리고 들끓어 오르며 꿈틀거렸다. 이리하여 그는 양 극단 사이, 얼음장 같은 정신성과 소모적인 관능의 화염 사이를 이리저리 불안하게 오가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기진맥진한 삶을 살아갈 뿐이었다. 요컨대 이것은 토니오 크뢰거가 혐오해 마지않는 극단적이고 상궤를 벗어난 남다른 삶이었다. 얼마나 길을 잘못 든 것인가! 하고 그는 가끔 생각했다. 어쩌다가 이 모든 이상야릇한 모험에 빠져들게 되었는가? 그래도 원래 나는 녹색 마차를 타고 유랑하는 집시는 아니지 않은가......"(42-43, 강조는 나)
상이한 맥락에서이긴 하지만 철학자들의 글을 읽다 보면 육체성 일반에 대한 혐오를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이 경멸해 마지않는 치장과 유혹 그리고 관능 모두 나에게는 삶의 가장 흥미로운 지점들에 속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괴리감을 느끼곤 한다. ⟪토니오 크뢰거⟫를 읽기 전에도 나는 언제나 나 자신이 두 세계의 경계에 서있어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한 쪽은 연애의 세계였고, 다른 한 쪽은 데카르트와 사르트르의 세계였다. 연애의 세계에서 나는 철학자들의 고귀한 영혼을 동경했다. 그러나 데카르트와 사르트르의 세계에서 나는 살의 촉감 그리고 온기를 그리워했다. 쾌락과 정신적인 고양 사이에서 지금의 나는 어디에 있는지? 요 며칠 사이엔 둘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앙드레 지드, <반도덕주의자> (0) | 2023.05.28 |
|---|---|
| 유희경, <당신의 자리-나무로 자라는 방법> (0) | 2023.03.26 |
| 하성란, <크리스마스 캐럴> (4) | 2022.12.19 |
| 마르셀 프루스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5: 게르망트 쪽 1 발췌 (1) | 2022.12.02 |
| 알베르 카뮈, <결혼 • 여름> (4) | 2022.1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