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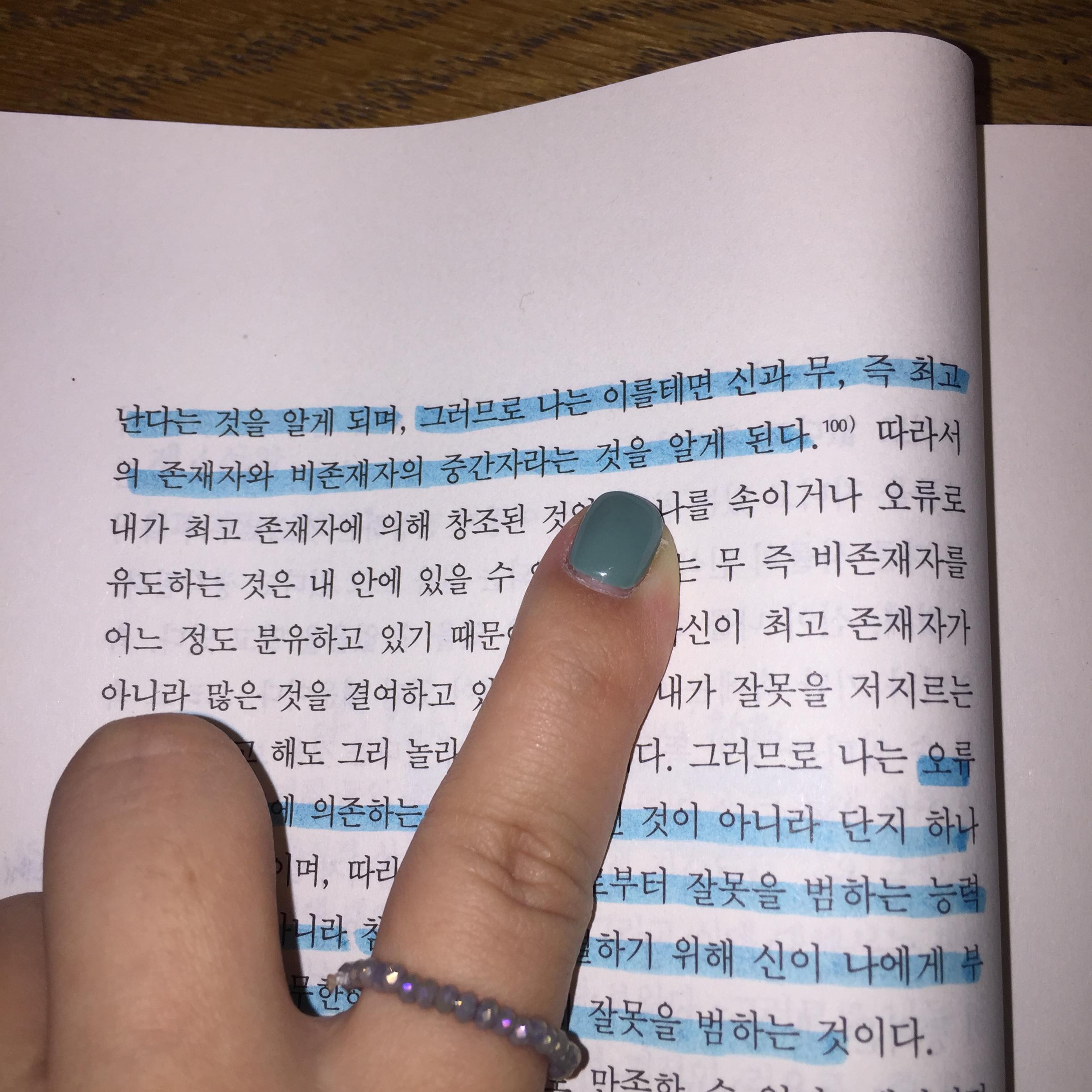
철학이 나를 구원해줄 것이라 생각한 적이 있었다. 사상이, 이념이, 개념이, 그리고 개념들이 조사들 사이로 수려하고 우아하게 앉아 있는 문장들이 나를 구원해줄 것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복수전공을 했고 대학원까지 왔다. 그러나 막상 제대로된 공부를 시작하고 나니 더 이상 철학이 생명의 밧줄을 내려주리라고는 믿지 않게 됐다. 나를 구원해주는 것은 철학이 아니라 철학함에 가깝다. 대책없이 난해한 책을 만나 당황하는 표정을 짓기. 당황한 마음을 뒤로 하고 입문서를 사서 잉크가 다 마르도록 형광펜을 긋기. 지루하기 그지없게, 반복적으로 요약하고 또 요약하기. 그리고 다음 날 또 다시 대책없이 난해한 책을 만나… 눈을 게슴츠레 뜨면 하얀 바닥 검은 벽의 미로처럼 형상화되는 활자들과 씨름하는 행위 자체가 나를 구원한다. 그리고 나란히 앉아 똑같은 씨름에 매달리는 사람들과 초콜릿을 나눠먹는 일이 나를 구원한다. 연구실 바깥으로 나가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문제에 대해 몇 시간씩 문답을 주고받고, 사소한 깨달음 몇 개를 수확하는 사태가 나를 구원한다. 이해하지 못했던 논증을 어느 날 문득, 또는 동료들과의 대화 가운데서 직관으로서 소유하게 되는 행운이 나를 구원한다. 생명력은 철학이 아니라 철학하는 사람들에게서 온다.
하지만 철학하는 사람들이 처해있는 상황들은, 내가 봤을 때, 정말이지 단조롭기 짝이 없다. <장미의 이름>을 영화로 찾아본 날이 있었다. 머리를 이상하게 깎은 수도사들이 쭈루룩 앉아 고전 텍스트를 필사하던 장면을 자주 상기한다. 그 필사는 특별히 하루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며칠, 몇 달, 몇 년동안 일정에 맞춰 지속됐을 것이다. 그들이 텍스트를 베끼며 감각하고 체화했을 단조로움과, 철학과 대학원 생활의 단조로움 사이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나는 그 단조로움이 나를 강화한다고 느낀다. (또는 나를 강화해줄 것이라고 소망한다.) 이따금 마음이 약해질 때면 나는 유사종말론자가 된다. 정말 사소한 사건에도 내 세계 전체가 무너져내릴 것이라 두려워 한다. 그럴 때마다 세계 멸망의 계기가 될 만한 모든 사건들을 목록으로 작성하고, 각각의 가능성을 과장되게 가늠한다. 터무니없는 데다, 무엇보다 자기확신을 병적으로 결여한 불안과 우울감 가운데서, 나는 간신히 생각한다. 그래도 내가 나의 일상을 이어나간다면. 이어나가기만 한다면. 내가 계속해서 칸트를 읽고, 헤겔을 읽고, 후설을 읽기만 한다면. 언젠가 하이데거와 사르트르를 독해하는 데 성공한다면. 어느 날 메를로-퐁티의 ‘살’ 개념을 이해해낸다면. 그리고 이 지리한 탐구의 결론들을 내 블로그에, 현실세계의 장소로 비유하자면 후미진 골목에 버려진, 아무도 들춰보지 않는 까끌까끌한 회색 덮개 아래에 존재하는 은밀한 공간에 기록해두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철학함이란 이름의 단조롭고 사실상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반복들을 강박적으로, 스스로를 밀어붙여가며 참아낸다면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설령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인, 누군가 나를 절망적인 수준으로 무자비하게 대하는 불상사가 벌어지더라도. 심지어는 철학함 때문에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으리라고 기도에 가깝게 생각한다.
P.S. 얼마 전에 백수린 작가의 산문에서 '박음질하다'라는 동사를 만났다. 자세한 맥락을 알아보고 출처를 명기하기 위해 책을 뒤져봤는데 찾지 못해 아쉽다. 그렇지만 그 동사 역시 중세 필사가들의 모습만큼이나 내 맘속 깊이 와닿았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박음질하듯 활자를 읽어왔고, 앞으로도 박음질하듯 읽게 될 것이다.
'잡담이나 소회 같은 것'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10410 내게 쓰는 일의 의미? (0) | 2021.04.10 |
|---|---|
| 20210325 가위 돌리던 아이 (2) | 2021.03.25 |
| 20200119 젊음 (0) | 2021.02.19 |
| 20201219 맥없지만 (0) | 2020.12.19 |
| 20200912 희망과 불안에 대해서 (0) | 2020.09.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