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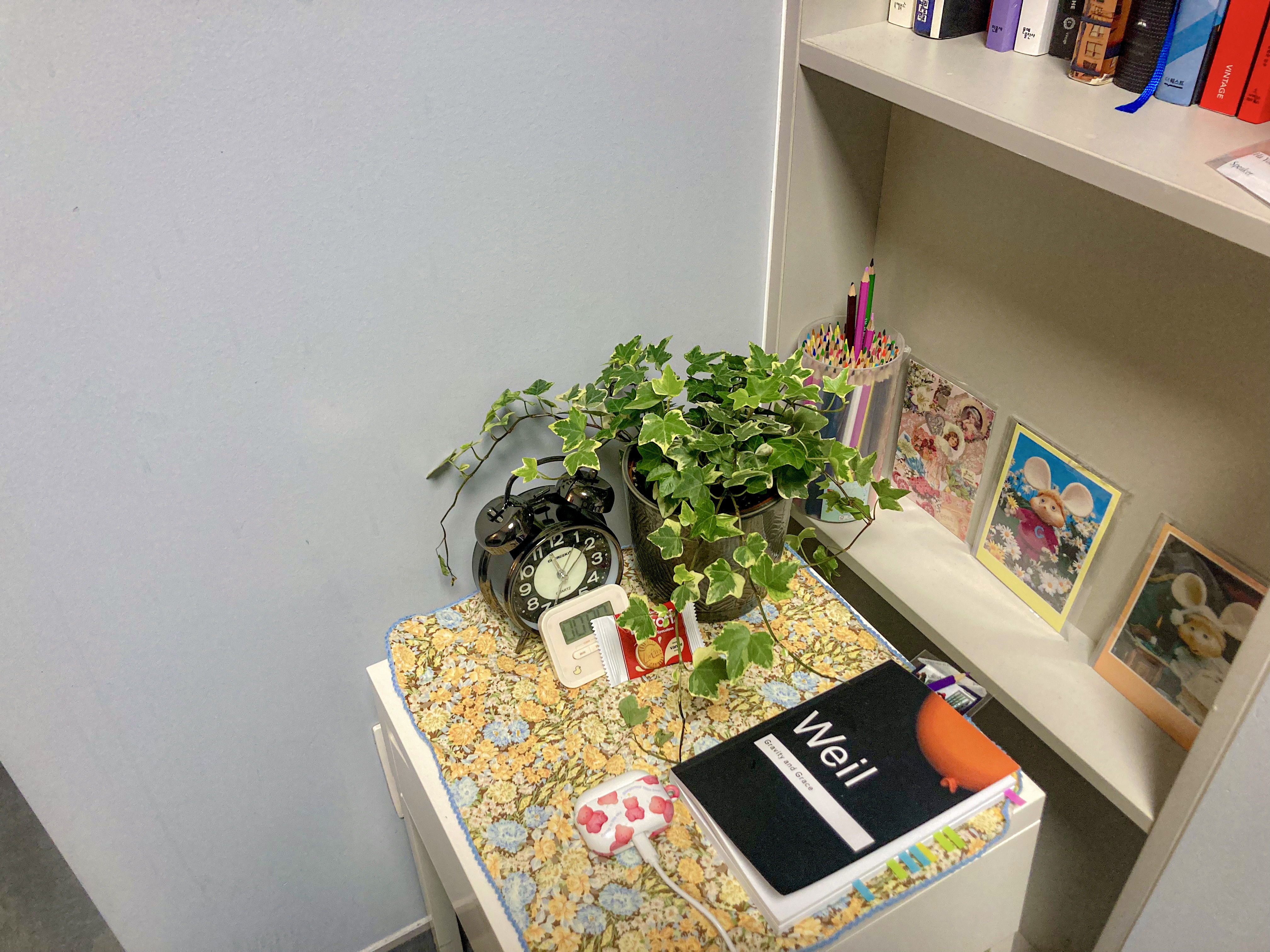
1. Henning Tegtmeyer, 'Schuld und Sünde'. In: Handbuch Religionsphilosophie (Hrsg. von H. Schulz et al.), Springer 2025, 413-424.
오랜만에 대도서관에 가서 읽었는데, 집중력이 흐려질 때마다 체스보드 무늬 스테인드글라스를 쳐다보면서 마음을 다시 다졌다. 생각했던 것보다 술술 읽힌다는 인상 반, 그래도 독일어 독해인지라 시간이 오래 걸려 난처하다는 인상 반. 보통은 세속적인 맥락에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데서 따르는 잘못(Schuld, 책임)과 명백하게 종교적인 맥락에서 성립하는* 죄(Sünde) 개념을 각각 정의하고 (무엇보다도) 둘 사이의 개념적인 중첩을 드러내고자 시도하는 글이었다.
*= (인격을 가지며personal 질서를 세우고자 하는 통일된 의지를 지니는 ) 신과의 관계에서 성립하는
우선 잘못의 세 가지 의미(aitia/causa=장본인됨Urheberschaft, hamartia/culpa, opheilema/debitum)를 나눈 것이 흥미로웠고, [공적인 처벌 제도와 함께] (의도적인 가해로서의) 쿨파가 (청산해야 할 물질적, 정신적 빚으로서) 데비툼으로 취급되기 시작했다는 관찰 역시 날카로웠다. 쿨파는 세속적인 맥락에서 잘못으로 규정될 뿐만 아니라, 신과의 유대를 훼손시키며 가해하는 인간 자신의 영혼도 파괴한다는 점에서 세속적 잘못의 개념과 종교적 죄의 개념을 비로소 연결 짓는다. 이시도루스에 따른 죄의 유형 구분, 아퀴나스에 따른 죄의 경중 판단, 죄의 원인으로서의 악덕의 의미 분석과 왜 인간은 악덕의 습득에 취약한가에 대한 물음이 이어진 뒤, 악덕에 대한 취약성 자체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한다는 원죄의 이론이 소개되는데, 이로써 잘못과 죄 사이의 새로운--상기한 것보다 근본적인--연결고리가 드러난다는 지적이 새로웠다. 잘못이든 죄든 모두 악에 취약한anfällig 인간의 본성 또는 조건으로부터 비롯하기 때문이다.* 종교적 사유에서 발원한 것이 분명한 죄의 개념을 세속적으로 전유할(aneignen)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대두되며 글이 끝맺어진다.
*[이 조건 자체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에?] 원죄는 오직 은총을 통해서만 구제 가능하다.
2. Henning Tegtmeyer, 'Sünde und Erlösung. Die Konstitution von Personalität im jüdisch-christlichen Denken'. In: Personalität. Studien zu einem Schlüsselbegriff der Philosophie (Hrsg. von Frank Kannetzky & Henning Tegmeyer), Leipzig: Leipziger Uni-Vlg 2007, 187-212.
사유의 밀도가 너무 높아서 논문 하나를 거의 일주일 동안 읽은 듯...... 그렇지만 신기한 독일어 단어들을 많이 익혔고, 신학적 테마를 철학적으로 소화하는 작업이 어떤 것인지 경험할 수 있었다. 나중에 혹시나 교수가 된다면 제자들에게 꼭 읽어보라고 추천할 것이다.
거칠게 요약하자면 창세기의 실낙원 신화를 인간의 인간됨(Menschwerdung) 또는 인격의 형성(Personwerdung)에 대한 우화로 재해석하는 글이다. 가치 (또는 규범), 궁극적으로 선(das Gute)은 개념적 정의상 주관을 초월한다는(transsubjektiv, subjekttranszendent) 고찰*, 나아가 (직업적 삶의 선택에서 드러나듯) 가치의 다원주의는 가치의 상대주의를 내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무척 인상적이었다. 메인 아규먼트는 다음과 같다:
(a) 동일한 사태가 이야기의 내부에서 가지는 의미와 외부에서 가지는 의미(전자에 의해 우의적으로 지시되는 바, 곧 우화의 소위 참뜻)를 구분할 경우, 아담과 이브의 '죄'는 (원래도 성립했으나 다만 그에 대해 무지했을 뿐인) 제 유한성에 대한 인식(Endlichkeitsbewusstsein), 곧 일종의 시간의식의 획득으로 드러난다. 자신이 죽으리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인간은 낙원을 잃고, 순진한 동물의 상태에서 벗어난다.
(b) 시간의식의 획득이 선악과의 소비 즉 규범적 판단력의 획득과 결부되는 이유는, 자신의 미래가 한정되어있다는 감각이 인간으로 하여금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가치있는 것과 가치있지 않은 것을--나누게 만들기 때문이다. 전자는 [어떤 질료적 내용Materie을 가지든] 행위의 형식적 목표(Formziel)를 만족하는 무엇을 의미한다. 이때 행위의 형식이란 어떤 행위를 바로 그 행위로 만들어주는 본질에 해당하며, 그에 상응하는 가치기준들로써 규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내용의 말이든] 말함이라는 행위는 정직성이라는 행위의 형식으로써 정의되는 것이다. 이 행위의 형식이 만족되지 않을 때, 곧 행위자가 (이를테면 특정한 질료를 위해 형식을 위반하여) 행위의 결여태를 선택할 때(또는 그에 처할 때) 악이 성립한다. 정직하지 않은 말은 사실 말이 아니라 말의 결여태에 불과한 악일 뿐이다.
(c) 시간의식과 규범적 판단력의 획득이 특별히 '죄'로 표현되는 이유는, 악에 대한 유혹이 인간의 본성에 구조적으로 내재되어있기 때문이다. 유한성은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게 하는 가치의 원천인 동시에, 허무주의를 부추김으로써 가치들의 가치있음을 취소하기도 하는 역설적 성격을 띤다. 이와 같은 유한성의 역설 자체--내가 읽기에는 가치의 초월적 의미에 대한 의심의 항구한 가능성--가 일종의 원죄이기에, 죄가 인식론적 언어로 재해석돼도 구원과 은총의 필요는 여전히 남게 된다. 구원이란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선의 이념을 시간성의 제한으로부터 풀어내는 것, 그리하여 자신보다 오래--정확히는 영원하게--지속되는 선에서 평온을, 곧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찾는 일이다. 선에 대한 참여로서의 구원은 학문 또는 정치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무척 공감하는 바다. 규범이라는 것은 정의상 그 기원이 나 바깥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스스로를 의무 지움(Selbstbindung, Selbstverpflichtung)'과 같은 사태에는 근거가 없다(grundlos). [내가 만든 규범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 부조리하다.]
3. Simone Weil, Trans. by Emma Crawford and Mario von der Ruhr, Gravity and Grace, Routledge, 2002.
문자 그대로 '아집'을 멈추고 기쁨과 극한의 고통 모두에서 동일한 수준의 감사함을 느끼라는 베유의 잠언들로부터 모종의 평온을 얻게 된다. 상상에 의거해 꾸며지는 환상과 그에 대한 애착, 주의에 의거해 드러나는 벌거벗은 실재와 그에 대한 인식으로서의 사랑 사이 대비가 글 전체를 이끌어나간다. 전자는 자아를 세계의 중심에, 후자는 신을 세계의 중심에 놓는 태도에 상응한다. 그녀의 경건함에 감탄하면서도, 세속인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신비주의 형이상학에 근거한 윤리학이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효용을 가질지 의심스럽기도 하다.
4. Silvia Caprioglio Panizza, The Ethics of Attention: Engaging the Real with Iris Murdoch and Simone Weil, Routledge, 2024 (chap 2, 3).
작가의 고운 마음씨가 딱딱한 철학적 문장들을 뚫고도 느껴져서 당황스러울 정도였다. (베유에게서 영향을 받은) 아이리스 머독의 윤리학이 자아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삭제하고자 하느냐에 따라 달리 해석되며 상이한 이론적 장단을 지니게 된다는 내용의 장들을 살펴봤다. 학회 참여를 위해 파더보른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리에주의 '콘스탄틴'이라는 카페에서, 리에주를 경유해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틈틈이 읽었다. 여담이지만 카페에서 사온 원두의 풍미가 무척 깊다. 지금도 마시는 중, 꼴깍꼴깍......

5. Richard Moran, 'Iris Murdoch and Existentialism', In: Iris Murdoch, Philosopher (Ed. by Justin Broakes), Oxford University Press 2011, 180-196.
간만에 엄청 잘 쓰인 해제 글을 만났다. 대도서관 앞 광장에서 보온병에 담아온 커피를 옆구리에 끼고, 일부러 햇살에 팔과 얼굴을 최대한 노출시키면서 읽었다. 이렇게 (특별한 오케이전을 제하면) 거의 항상적으로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무척 보람차기도 하고, 괜히 쓸쓸한 느낌도 있다. 아무튼 아이리스 머독이 실존주의를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 실존주의자들에 대한 일종의 의도적인 왜곡 혹은 캐리커처에 의거한 것이며, 사실 그녀의 윤리학은 실존주의의 유산--구체적으로는 상황에 대한 강조--에 기반해있다는 주장이 실려있다.
6. Edmund Husserl, Einleitung in die Ethik: Vorlesungen Sommersemester 1920/1924 (Hrsg. von Henning Peuker), Dordrecht: Kluwer, 2004 (Hua XXXVII).
48절과 49절을 진짜 끔찍할 정도로 꼼꼼하게 읽었다. (다시 읽어야 하면 구토할 듯.) 교수님과 세미나를 하고 있기도 하고, 논문과 직결되는 주제다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보다 진지한 마음이 앞섰다. 재미는 머독과 베유 공부에서 찾는다.
7. Bernard Williams, Shame and Necessi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chap 1, 2).
인간의 행위자성, 책임, 후회, 필연성과 관련된 고대 그리스인들의 윤리적 전망과 현재 우리의 윤리적 전망이 생각보다 많이 닮아있으며, 근대 윤리학이 제시하는 전망보다 나을 수 있다는 주장을 담은 책이다. 철학 책이지만 고대 그리스의 비극을 주 텍스트로 삼는다. 인문학 도서관에서 정리하면서 창밖으로 날이 갠 하늘을 흐뭇하게 바라봤던 기억이 난다.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4-5월의 독서 (0) | 2025.05.05 |
|---|---|
| 버나드 윌리엄스, <윤리학과 철학의 한계> 요약 (0) | 2025.03.29 |
| 2025년 1월의 독서 (2) | 2025.02.07 |
| 2024년 늦가을과 초겨울의 독서 (28) | 2024.12.14 |
| 버나드 윌리엄스, <가치의 충돌(Conflicts of Values)> 요약 (2) | 2024.11.0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