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rnard Williams, ‘Conflict of Values’ in Moral Luck: Philosophical Papers 1973-198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pp. 7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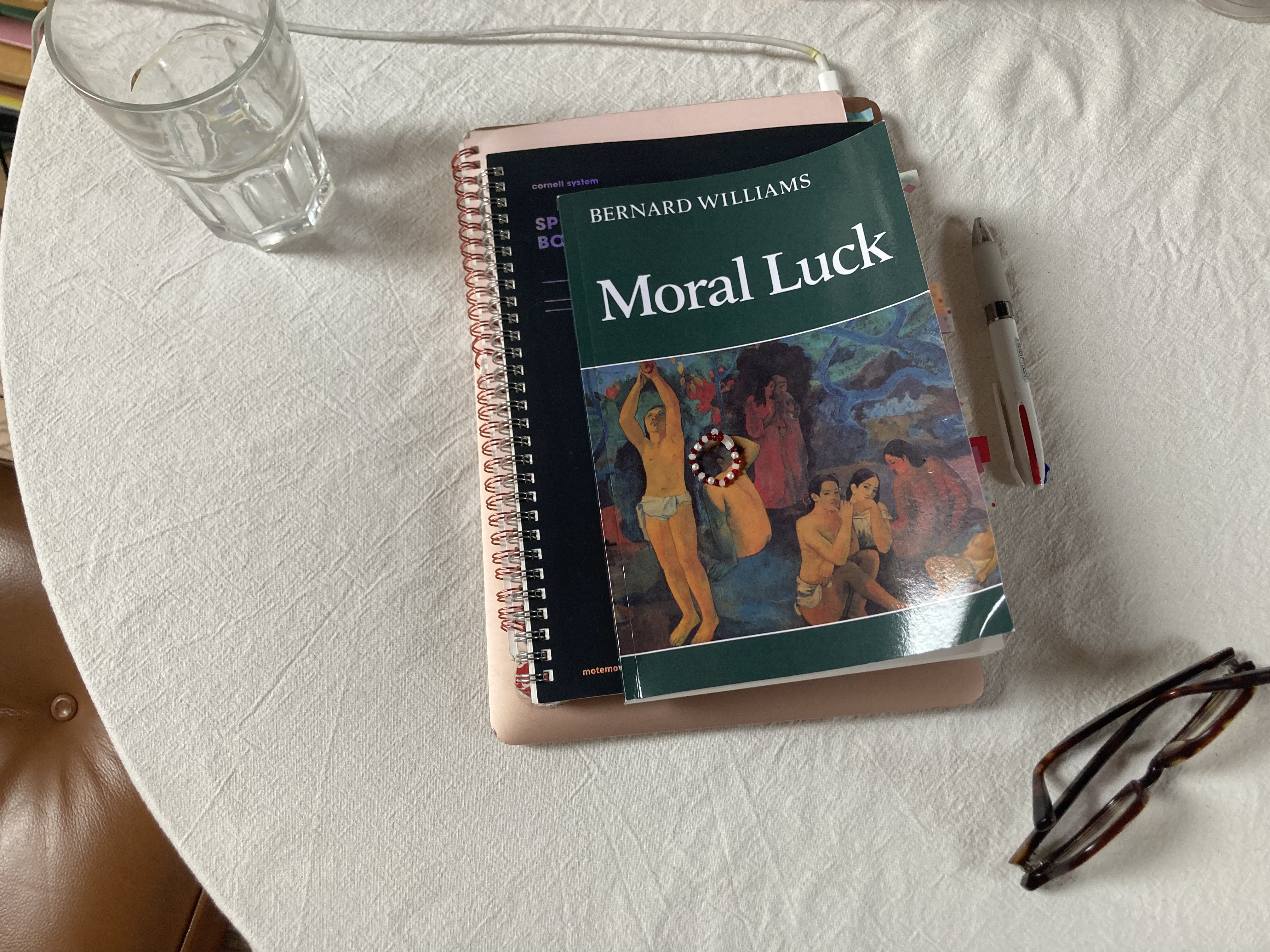
가치들이 [문자상에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수(plural)인 데다 서로에게로 환원이 불가능해(irreducible) 갈등하는 상황에 대해 성찰한 글이다. 문제시되는 여러 가치들 중 어떤 하나의 (또는 그 이상의) 가치는 반드시 상실할[=희생될] 수밖에 없는 이 같은 가치들 사이의 갈등은 병리적인 것, 그리하여 이론이나 역사적 과정을 통해 극복되어야 할 것이 아니다. 그 같은 견해에 반해 윌리엄스는 가치 간 충돌을 필연적일[불가피할] 뿐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인간적 삶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는 무엇으로 본다. 나아가 윌리엄스는 충돌의 해소(resolution)에 대한 필요(need)가 단순히 논리적[으로 모순율이 못마땅한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인격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에세이의 초반부에 윌리엄스는 가치들이 서로 갈등하는 (듯한)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다. 첫째는 (표면에서 보이는 바와 달리) 사실은 갈등이 없는, 종국에는 실재하는 가치가 하나뿐인 경우다. 둘째는 갈등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무게가 다른 하나의 무게보다 정당하게 앞서서, 안타깝게 포기된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조차] 정당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다. 마지막 경우가 윌리엄스의 관심사인데, 바로 그 어떤 가치의 무게도 비교되고 있는 다른 가치의 무게보다 정당하게 앞서지 않는 비극적인 경우다. 이 경우에는 안타깝게 포기된 가치와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이 불만을 정당하게 제시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때 윌리엄스는 이 갈등이 결코 단순히 행위자가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논리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힘주어 말한다.* 가치 간 갈등은 [논리적이기만 한 차원의 너머] 상황 자체에 [내재되어, 즉 실재하는 채] 전개되고 있다. 쉽게 말해 가치 간 갈등이란 판단들 사이의 모순이 아니다.
*논증까지 하는지는 모르겠다.
한편 비극적 가치 충돌의 상황을 [논리학이나 윤리학 이론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으로 해결하고자 할 수도 있다. 그때 물어야 할 것은 바로 "행위자가 무엇을 하든 옳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임이 [도대체가] 불가능하려면 이 세계와 이 행위자에 대해 무엇이 참이어야 할까?”다(75). 그러나 세계의 운행에 간섭하는(interventionist) 신을 끌어오든, 모든 행동을 효율의 문제로 환원해 생각하든 [가치론적 비극의 불가능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증명은] “도덕적 체험의 실제적(actual) 위치를 간과한다(leave out).”(75)* [실은] 이 비극이야말로 도덕의 객관성이라는 이념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일 테]다.** [단] 그 어떤 가치나 미덕도 놓치지 않고 모든 가치들—이를테면 자유와 평등—을 한꺼번에, 어느 것을 조금도 희생함 없이 조화시킬 수 있다는 유토피아니즘은 허위적이다.***
*cf. 후설의 섭리이론 (Hua XLII, 196ff.)
**이 한 대목을 제하면 윌리엄스에게서는 후설이 그토록 피하고자 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또는 회의주의의 존재감이 옅어 보인다.
***사회적 조건이 개선되기만 하면 아무 가치론적 상실도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보부아르는 ⟪애매성의 윤리학⟫에서 '진지함'으로 개념화해 비판한다. 보부아르는 자신의 도덕적 커미트먼트의 암면을 [아예 모르거나 외면하는] 진지함의 태도에 반해 애매성을 인수하는 태도를 옹호한다. 한편 후설의 유토피아니즘은 윌리엄스가 그에 대해 회의적인 "계몽 혹은 통찰(insight)"을 담지하고 있을까? (80, cf. Saulius Geniusas, 'Husserl's Post World War I Ethics', 2023)
윌리엄스는 [가치의 비극적 충돌을 논리적으로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야기하는] 가치의 비교 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을 옹호하는 주장의 네 가지 버전을 제시한다. 더 나중의 것은 앞의 것(들)의 참됨을 말하자면 포함하는 보다 강한 주장이다. 무식한 직역은 용서해주세요.
(1) “그에 의거해 각 가치 충돌[의 사례가] 해소(resolve)될 수 있는 한 개의 통용 가능한 기준(currency) [같은 것은] 없다."(77) [⇔다수의 가치들을 다소간 동질적인 가치 또는 오롯이 한 개의 가치로 환원할 수 없다. 가치들은 문자 그대로 다수이며 실재로서 다수다.]
(2) "각 가치 충돌[의 사례]에 대하여 당장 충돌하고 있는 가치들로부터 독립적인 어떤 가치가 있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그에 호소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은 성립하지 않는]다."(77)
(3) ""각 가치 충돌[의 사례]에 대하여 (독립적이든 아니든) 어떤 가치가 있어 갈등을 합리적으로(rationally) 해소하기 위해 그에 호소함이 가능한 [그런 상황은 성립하지 않는]다."(77)
(4) "그 어떤 가치 충돌[의 사례]도 결코 합리적으로 해소될 수 없다(No conflict of values can ever rationlly be resolved.)"(77)*
*Q. 여기서 '합리성'은 무엇을 뜻하는가? 이를테면 외적인 강제나 권력의 집행으로 해소된다면 합리적 해소가 아닐 것 같기는 한데. 후설의 경우에는 합리성 자체가 갈등의 부재를 함의하고(e.g. 합리적 사랑들 사이의 충돌은 이념적으로는 불가능), 보부아르의 경우에는 그녀가 사르트르의 형이상학을 모두 받아들인다고 가정한다면 인간의 존재론적 자유가 이미 [어떤 의미에서는] 합리성을 담보한다.
첫째, 윌리엄스는 (1)에 맞서 가치의 충돌을 보편적으로 조정해줄 수 있는 그럴 듯한(plausible)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공리(효용, utility)뿐이라고 가정한다. 그리하여 (1)의 반론으로는 (i) 모든 가치들은 결국 공리라는 하나의 가치로 환원된다는 강한 공리주의적 주장, (ii) 모든 가치들은 [비록 공리와 다르고 다수지만] 공리에 의해 그 가치있음이 간접적으로 입증된다는 약한 공리주의적 주장, (iii) 딱히 가치들이 직간접적으로 공리에 의해 그 가치있음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지만, 즉 공리는 이 가치들과 [전혀] 관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는 [그 특수한 성격 탓에?] 최종 심급이 되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한편 둘째, (1)이 참이라면 (2)는 당연히 참이 된다. 가치들 사이의 공통의 계산 기준이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을 경우, 가치론적 이자충돌의 그 어떤 경우에서든 제3의 가치가 반드시 있어 조정의 역할을 떠안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기 때문이다. (1)과 (2) 모두에 반해, 만일 당장 문제시되고 있는 가치들과 지나치게 동떨어진 가치가 그럼에도 통화 역할을 하기 위해 동원될 수 있다고 반론한다면, 그 경우 충돌에도 불구하고 결정(decision)을 내리게 해줄 이유(reason)야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해당 가치들의 비교 가능성이 진정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셋째, (3)은 충돌하는 가치의 각 항을 A와 B라 부를 때, A가 어떤 방향에서는(in some direction) B를 희생시키지만 어떤 방향에서는 증진시키므로 비교가[--곧 합리적으로 근거 지워진 선택이--]가능하다는 식의 주장과 대립된다. 물론, 비교 불가능성을 견지하면서도 A와 B가 함께 증진되는, 그리하여 하나가 상실되지 않는 방식의 [해석이] 가능한 특수한(구체적인, particular) 사례들이 존재함을 인정할 수는 있다.
[어떤 경우에서든, 유토피아니즘이 잘못된 것처럼, 그러나 다른 근거에서] 도덕적 믿음을 체계화하는 윤리학 이론을 통해 가치 간 충돌 및 도덕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잘못됐다(misguided). 왜냐하면 주지하다시피 가치 간 충돌에서 문제시되는 것은 사고나 명제들 사이의 논리적 모순이 아니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윤리적 문제에 이론적 합리성의 잣대를 들여와선 안 된다고 거듭 말한다.* 가치 간 갈등의 해소나 완화에 대한 필요, "그리고 우리네 도덕적 사고를 합리화할[도덕적 판단에 이유를 무장시킬] 필요"는 논리나 이론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개별-인격적인(personal) 기반"을 갖고 있다(81).
*Q. 후설은 윌리엄스의 이 반론을 피해갈 수 있을까? 후설은 '윤리적 모순율'과 같은 것에 개입하는 듯이 보인다. 즉 지식에서의 상대주의와 윤리에서의 상대주의를 동형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사적인 영역에서는 사실] 개별-인격적인 직관(intuition)이 (더 이상의 이유가 [갈등 당사자 누구에게도] 요구되지 않는 방식으로 상황을 전개시켜) 가치 간 갈등을 해소하곤 한다. 다만 복잡성이 배가된 근대의 사회에서는 가치의 취사선택과 같이 "윤리적으로 유의미한" 결정을 [대개] 공적 행위자가 내리게 되며, 이처럼 공적인 결정은 [근본적으로] 인격과 무관하고(impersonal) 직관의 산물만으로는 저에게 요구되는 책임(answerability)을 감당할 수 없다. 사적인 영역에서보다 공적인 영역에서 더 높은 수준의 합리화(이유-제공하기, rationalisation)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직관을 통한 갈등 해소가 가능한 사적 영역에서는 공적 영역에서보다 더 많은 충돌이 용인되곤 한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사적인 영역[에서의 이유 제공]과 공적인 영역[에서의 이유 제공]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롤즈가 상식과 철학 사이의 반성적 균형을 말했듯, 공과 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방식 사이의] 반성적 균형이 필요하다.
'철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2025년 1월의 독서 (2) | 2025.02.07 |
|---|---|
| 2024년 늦가을과 초겨울의 독서 (28) | 2024.12.14 |
| 2024년 8-9월의 독서 (7) | 2024.10.10 |
| 지그문트 프로이트, <나르시시즘 서론(Zur Einführung des Narzissmus)> 외 (1) | 2024.09.16 |
| 패트리샤 처칠랜드, <양심: 도덕적 직관의 기원> (3) | 2024.0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