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 드 보부아르, 강초롱 옮김, ⟪아주 편안한 죽음⟫, 을유문화사, 2021.
"그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장례식 예행연습을 하러 가는 길이었던 셈이다. 불행한 점이라면 모두가 공통적으로 겪어야 하는 이 일을 각기 혼자서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리라. 엄마는 회복기라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임종에 이르는 과정에 해당했던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엄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엄마와 근본적으로 갈라져 있었다."(1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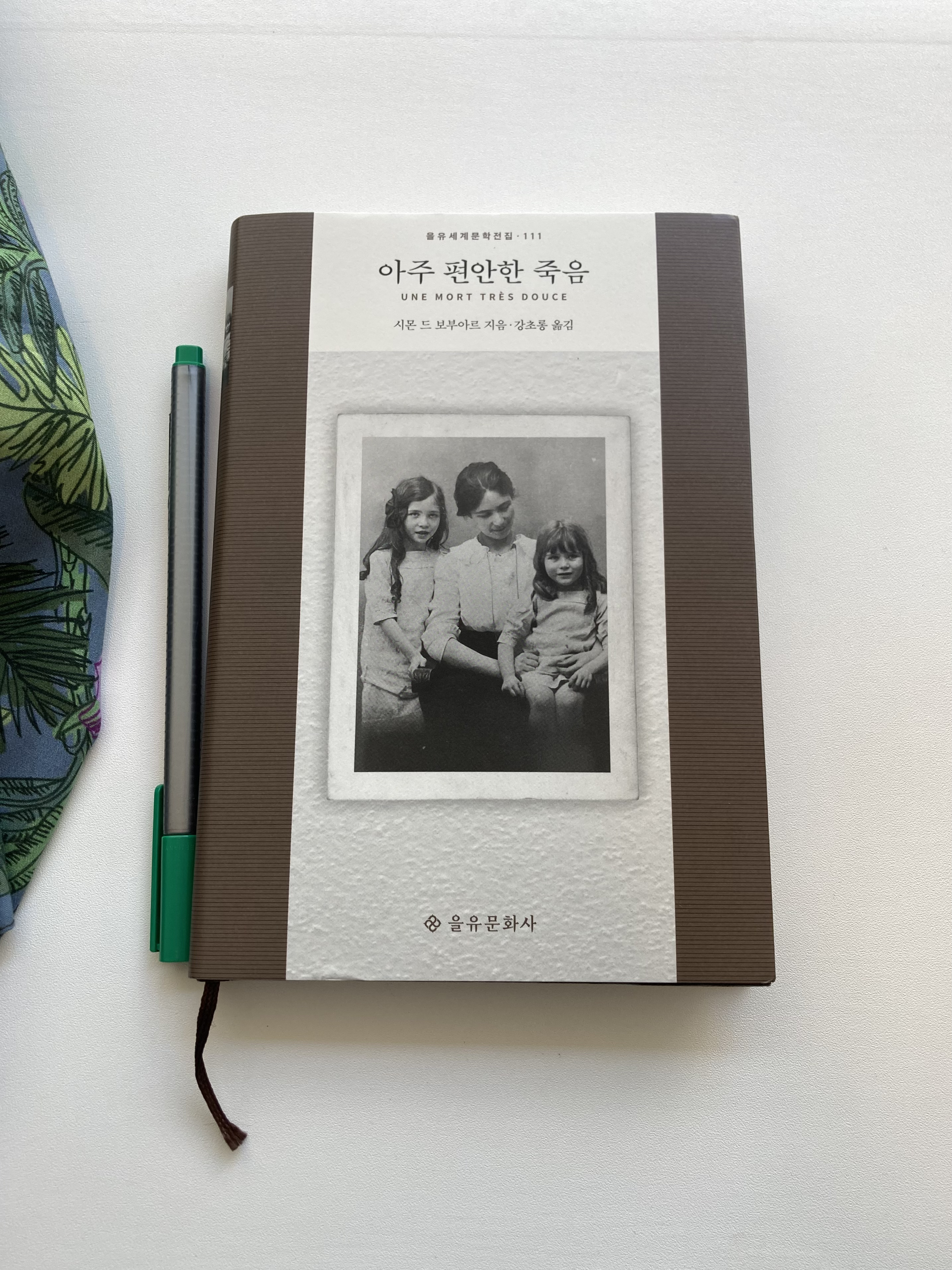
보부아르가 자신의 어머니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관찰하고 느꼈던 바를 기록한, 소설보다는 수필에 가까운 글이다. 이 글에서는 보부아르가 ①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②어머니가 과거에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사실과 화해하는 과정과 서로 중첩되어 있다. 이로써 보부아르는 죽음이라는 일상에 이질적인 사건과 어머니의 억압, 억압으로부터 도피한 자기 자신, 나아가 가부장제 하에서의 여성 모두의 고통스러운 실존을 그것의 부당함에 대한 문제의식은 잃지 않는 채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내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불편감은, 과연 보부아르의 어머니는 치부라고 말할 수 있다면 치부인 자신의 모습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죽어가는 과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된 이 글의 출간을 허락했을까 하는 의구심과 관련된 것이다. 이 글이 출간됨으로써 프랑수아즈 드 보부아르는 적어도 그녀의 딸 시몬의 매우 광범위한 독자들에게는 '죽음을 앞둔 여자'라는 제한된 인상으로 기억되기가 쉬워졌기 때문이다. 물론 보부아르의 서술들에는 아프기 이전의 프랑수아즈의 역사를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그녀를 가족을 위한 희생양이 아닌 하나의 오롯한 주체로서 되살리려는 노력들이 듬뿍 담겨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프랑수아즈가 보부아르의 글쓰기를 위해 수단화되었다는 감각을 떨치기가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보부아르를 비난할 생각이 있는 것은 아니다. 글쓰기가 허구의 가면을 쓴 자기표현인 한, 나 역시 비슷한 고민들을 안고 살아왔고 또 당장만 해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는 작가가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이다.
'문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다자이 오사무, <인간실격> (0) | 2022.06.11 |
|---|---|
| 다와다 요코, <글자를 옮기는 사람> (0) | 2022.04.19 |
| 한정현, <줄리아나 도쿄> (2) | 2022.03.29 |
| 알베르 카뮈, <최초의 인간> (0) | 2022.03.24 |
| 우다영, <북해에서> (0) | 2022.03.14 |


